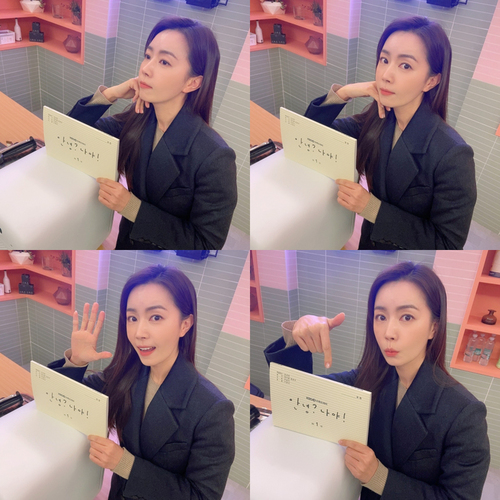산길을 걸으며 과연 논어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반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상적인 글귀들, 그때마다 떠오른 생각들, 이런저런 감회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마치 컴컴한 객석에 앉아 부지런히 돌아가는 낡은 영사기 소리를 듣는 듯 오래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산길을 걸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춧돌만 남은 옛 망루 터에 잠시 앉았습니다. 현상 같기도 하고 상상 같기도 한 영화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슨 영화를 봤지?’ 라는 느닷없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곧 절망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빠져들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감정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논어라는 제목을 아니 논어라는 ‘말’을 힘차게 집어 올렸습니다. ‘말을 따진다’는 그 논어에 어찌 한 마디 말도 대꾸할 수 없는가! 절망은 곧 분노로 치닫습니다. 독자로서 마주해야 할 책은 어느새 부모님 원수를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분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노의 파도 속에서 말을 따진다는 그 논어의 대상 전부가 ‘말’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구나! 모두 말이구나! 모두 남의 말이구나! 따져야 할 게 말이구나! 따져야 할 게 남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자 ‘남의 말이란 무엇인가?’, ‘남의 말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말에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곧 ‘함부로 남의 말을 생각해 자기의 생각을 끼어 넣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남의 말이었습니다. 남의 말이라는 말이 지닌 뜻 곧 남의 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정의(definition)란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고려되는 고유한 특성’(스피노자)이라는 점에서 정의로서의 이 답은 다른 그릇된 답을 그릇된 것으로 증명하는 답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릇된 답의 대표적인 것으로 남의 말의 이해에서 ‘목적론’ 또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목적’을 갖게 되면 남의 말을 왜곡하게 됩니다. 남의 말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대상적 사실’로서 다만 감각을 통해 수용되는 게 아니라 목적에 짜 맞춘 ‘가공된 사실’로서 조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이미 해석입니다. 사실이 해석으로 돌변하는 순간, 사실을 우선 수용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따져야 하는 (진정한) 해석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사실을 따지는 해석만이 ‘허용될 수 있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남의 말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국 해석에는 두 가지의 해석, 진정한 해석과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전혀 질이 다른 해석이 있는 셈입니다. 다른 한편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목적에 짜 맞춘 가공된 사실을 따지는 해석, ‘허용될 수 없는 해석’도 있으니까요. 목적에 짜 맞춘 가공된 사실 자체가 이미 해석이며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석은 ‘해석의 해석’이 됩니다. 즉 ‘합리화’, ‘정당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하여!’를 구호로 하는 모든 목적론적 사유가 배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이 가령 정의나 선을 표방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목적을 같은 계열의 말인 ‘의도’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론을 단호히 배격하는 이런 태도는 달리 ‘해석에 반대한다’(수전 손택)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생각해 자기의 생각을 끼어 넣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에서죠. 결국 남의 말은 무엇이며 남의 말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통해 남는 최후의 문제는 바로 ‘남’이라는 한 마디입니다. ‘대체 남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구해졌습니다. 읽고 있는 논어가 취하고 있는 독특한 형식이 그것입니다.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논어는 다른 책과는 달리 모놀로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어의 대화는 달리 말하면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환은 ‘대관계’ 곧 ‘남’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논어는 ‘인(仁)’을 말합니다. 그 인의 핵심을 ‘서(恕)’에서 구한 일본의 사상가를 떠올렸습니다. 이또오 진사이(伊藤仁齊, 1627~1705)입니다. 일본사상사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그를 더 알기 위해 전에 그가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쓴 어맹자의(語孟字義)에서 서는 촌도(忖度) 곧 ‘남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본사상사에서는 진사이를 남이라는 타자를 발견하고 이 타자를 중심으로 사유를 전개한 독특한 사상가로 평가하는 데, 이 촌도라는 한 마디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레비나스라고나 할까요. 이 촌도에 대해서 그는 부언합니다. ‘남의 마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삼고, 남의 몸으로써 자기의 몸을 삼는다(以其心爲己心, 以其身爲己身).’ 나와의 대화는 교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놀로그입니다. 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남을 발견하고 그 남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교환입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은 용도폐기 되듯 남과의 교환을 통해서 나는 남과 어울릴 수 있는 실마리도 얻습니다. 인간의 ‘반성(reflection)’이란 것도 이 교환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환의 대상이 바로 남’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사회에서 사회를 사회로 만드는 피, 혈류는 이 교환이란 한 마디에 있습니다. 논어를 읽거나 남의 말을 따지는 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을 남으로 대접하고 남으로부터 저도 남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략 생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 일어서야지요. 산길을 걷습니다. 걸음이 좀 가볍습니다. 어느덧 청량산 너머 겨울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논어를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잠이 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밤으로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날 것도 같습니다. ‘산자’의 고유명에 ‘어질 인’자를 남겨주신 아버지, 당신이 문득 그립습니다. 걸음이 향하는 곳, 그곳은 바로 온갖 교환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사회’이군요.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