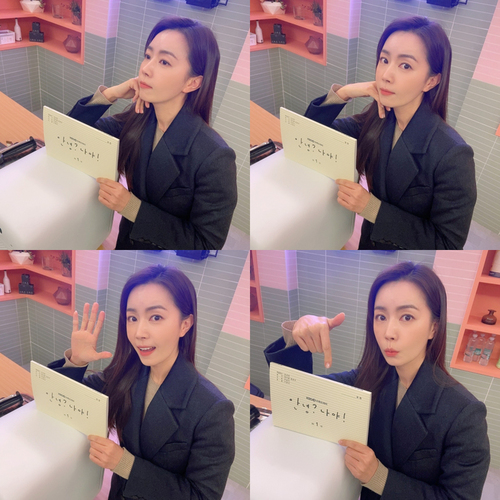자랄 대로 자란 손톱 발톱에 불쑥 눈이 갔다. 깎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냥 인다. 틀림없이 위생학적 사고가 아닌 습관에서 비롯된 것. 손톱 발톱을 다 깎고 난 뒤 떨어져나간 내 몸의 일부, 때론 누군가 미운 놈 얼굴을 거칠게 할퀴었을 지도 모를 내 몸살이의 일부가 바닥에 널부러진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스개 질문이 터진다. '내 몸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내 몸살이가 뭐야?' 한 때 얼마나 채우려고 안달을 부렸던가. 한 때 얼마나 취하려고 애를 썼던가. 아니 조금 느낀 바 있다고 해서 또 얼마나 보존하려고 힘겨워했던가. 그런데 손톱 발톱은 저렇게 떨어져나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듯이 태연자약 널부러져 있다니! 저 능청스러움! 내밀한 경계에서 삶이 슬픈 까닭은, 때때로 가혹한 고문처럼 심장을 파고드는 까닭은 이 때문인가. 떨어져나간 손톱 발톱은 내 몸이 내것이 아니라는, 내 몸살이 또한 내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로 눈을, 가슴을 찌른다. 그런데 희한하다. 삶의 슬픔, 가혹함마저 엄습하는 한 인간을 향해 마냥 비아냥과 조소를 흘려내면서도 자신은 정작 태연자약한 저 증거, 저 능청스러운 실재!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돌고도는 삶과 삶이 외면해버렸거나 잃어버린 실락원 사이에서 깊고 너른 강이 흐르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건널 수 있는 가능성과 도저하게 흐름으로써 정작 건너지는 못하는 배회의 가능성 사이에서 그 강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접자. 어차피 떨어져나간 손톱 발톱을 쓰레기통 속에 버리고 나면 이 순간을 잊게 될 테니까.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다시 또 사랑하고 미워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내 몸살이의 지금, 여기이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 강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지도 모를 나를 부르는 손짓, 그 홀릴 듯한 손짓을 언듯언듯 되풀이하는 한, 그 강을 건너는 몸 가벼운 나비의 이미지가 언듯언듯 비치는 한,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 나는 무엇을 잊지 않고 사는가? 제것이 아니면서 제것인냥 변명하고 우겨대는 한심한 놈들! 나와 내 가난한 이웃과 만물의 터전을 작살내온 그 놈들! 그럴 듯해 보이는, 뛰어난 듯 보이는 그 놈들의 쇠덩어리 같은 의식을! 증오해! 분노해! 녹여버릴 거야! (거꾸러진다고 해도 나는 내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