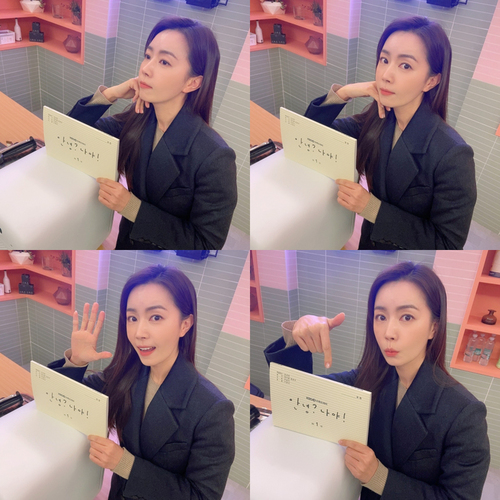가을이 깊어갑니다. 날마다 창을 통해 가을이 깊어가는 남한산을 바라다봅니다. 이따금 그 산에 들어 놀기도 하지요. 그 숲에는 노랗게 또는 노랗게 물들다가 붉게 변해가는 나무들로 그득하지요. 그 숲에는 벌써 그 자체로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드러내는 탈색된 낙엽을 떨구며 훌렁 몸을 벗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 깊어가는 남한산으로부터 요즘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란 어떤 것도 이루지 않고 어떤 것도 채우지 않으면서 그냥 변화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죠. 요즘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마감하곤 합니다. 이런 느낌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마주서는 것은 이 세상이 다름 아닌 목적들, 의미들로 넘쳐나고 그만큼 충돌과 따라서 이합집산을 거듭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의 모습이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아니 살아가기보단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치달리고 있지만, 결국은 악다구니 같은 표정들,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들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체적인 삶에서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삶에서나 목적들, 의미들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요. 그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니까요. 우리네 삶이란, 우리 같이 나약하고 따라서 하찮은 존재들이란 어쩌면 갖가지 목적들, 의미들로 채워진 삶과 죽음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삶의 풍토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불현듯 남들 또한 자신의 목적들, 의미들의 허망함을 강하게 느낄 때가 찾아들곤 합니다. 이 때 삶은 뒤죽박죽이고 심경은 더더욱 괴롭지요.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삶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언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문학이건 종교건 철학이건 아니면 벗처럼 느껴지는 지근거리의 누군가가 들려주는 언설이건 자신이 실감나게 체험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있는 것들, 다 자기 밖의 도구나 계기에 불과한 겁니다. 남는 것은 따라서 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스스로 변화하는 길일 겁니다. 이 길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점에서 실은 매우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놓여 있는 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어서는 길이니까요. 이 길은 간략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자신으로 가는 스스로의 길입니다. 지운다고 말하든 버린다고 말하든, 더 강렬하게는 남김없이 지우고 버린다고 말하든, 이 길은 지금까지의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가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을 휘감으며 엄습하는 절대적인 듯한 고독의 휩싸임이 다름아닌 이 길을 밟아나가는 동력입니다. 생각을 중지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바보가 되지 않고는 멍청이가 되지 않고는 모든 사태들을 바보 멍청이로 물끄러미 보는 그런 체험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바로 여기 이전의 자신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따라서 무매개적인 이런 체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물어보는 것도 따라서 답하는 것도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체험하는 세계이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거나 묘사한다는 것은 그런 마지막의 세계마저 생각의 관점 바로 인간을 생각의 관점으로 환원하는 데카르트적 코기토주의(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오염시키려는 그야말로 허튼 짓거리이니까요. 이런 체험이 가령 종교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선(禪)의 체험과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체험은 오직 자기만의 체험이며 스스로 일으키는 체험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유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의식이 맑아지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식의 그 맑은 상태에서는 생각을 일으키고 의미나 목적을 짓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느낍니다. 이런 느낌 속에서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물들 뿐입니다. 그 사물들이 짓는 순간들과 표정들, 그 순간들의 차이들이 짓는 연속들이 남습니다. 또렷하게 그 정지와 변화가 포착됩니다. 이 세계를 이루는 사물들이 사물들 그 자체로 비로소 자신에게 마주서는 것이죠. 그 때 불현듯 알아차립니다. 사물을 사물로서 마주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물의 사물인 바로 자신. 그리하여 사물과 사물의 사물인 자신만의 관계, 사물과 자신만의 무매개적인 관계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이런 관계를 삶에서 놓치지 않는 태도 속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놓고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갈라지는 오랜 철학적인 질문은 그야말로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을 따라 자신이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그리하여 그런 자신을 따라 사물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을 걸고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전혀 다른 몸짓으로 마주서는 별유천지(別有天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별세계는 이 세상 밖에 따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저 세상이자 정확히 이 세상 자체라는 점에서 이 세상 안에서 저 세상라는 두 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체 삶에 무슨 목적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이 별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소리나 늘어놓으며 “예로부터 잘 듣는 이 있어 어쩌면 지음이 있을 지도……(古來聰聽者 或別有知音)”(李贄, 秋懷) 하는 무심한 기대나 가져보는 수밖에요.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