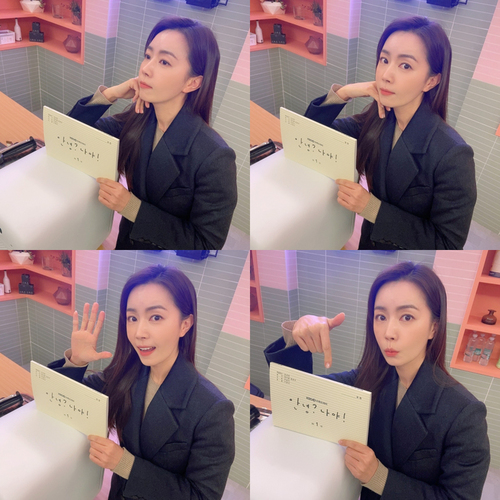별볼일 없는 기자짓 또는 두서없는 글장난. 지금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일을 했으니 그 때와는 아주 다른 사정인 셈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도 아직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따져보니 여러가지가 있다. 사명감, 습관화된 글쓰기, 지역사회에서 맺어온 유무형의 사회적 관계, 사물과 현상에 대한 코드풀기 의지 등등.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 녹아든, 일의 보람이 아닌가 싶다. 이 보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독히 개인적인 것, 자기만족적인 것이라 결국 보수 없이 일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없는 셈이다. 게다가 그 무엇에도 절대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양보할 수 없는 기질이 있어 자기만족적인 행위조차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긴 무거운 의미란 당초 있지 않을 테니. 이런 까닭에, 그리고 그간의 체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지역언론을 살려야 하느니,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느니 따위의 고상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기자들, 지인들, 공론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돈 있는 이들에게조차.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여기에서 하기로 한다. 그마저 할 수 없다면? 간단하다. 하지 않으면 된다! 홀가분하다. 언제고 생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아직 남아 있으니, 아주 유쾌한 일이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운 게 있으니, 반복되는 권태로운 일상이 그것이다. 그 결과 창발적인 사고가 떠오르지 않고, 종종 태도의 유연함이 굳어지고, 굳이 부리지 않아도 될 짜증이 일고, 그러다가 가난이 피부에 와닿고 몸마저 아플 때는 그나마 지탱하던 일의 보람마저 무너지는 처연함이 엄습한다. 적지 않게 산 느낌이 없지 않은 데 삶의 기술, 그 훈련이 아직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상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번뜩거림을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그렇다고 일상을 자재롭게 운용하는 고답적인 이들을 준거삼을 수는 없다. 처한 삶의 조건이 늘 중간자가 아닌가. 모든 중심에는 늘 이데올로기와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그것을 경계하고 비판해온 회색인간이 걸어야 할 길은 오직 취사선택 뿐. 그리고 그 취사선택의 지향은 소통에 둔다. 두통에 시달리던 하루의 끝을 상상력으로 밀어낸다. 황혼이면서 새벽, 짧은 사람이면서 고목, 구름이면서 하늘, 태양이면서 달, 독수리이면서 쥐, 글쓰기이면서 몸쓰기, 사내이면서 아내, 남자이면서 여자, 어른이면서 아이……마음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을까. 니체가 말했던가. 아직 밟아보지 못한 천 개의 작은 길이 있다고. 그러나 밟고 있는 한 개의 작은 길도 너무 커서 삶은 아직 살만하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