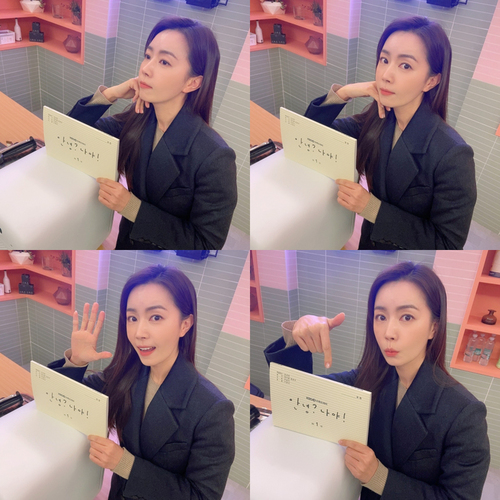어떤 사람을 말할 때, 혹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라고 한다. 얼굴은 ‘가릴 수 없는 노출’(레비나스)인가? 혹자는 그 사람의 눈을 보라고 한다. 눈은 ‘존재의 들여마시기와 내쉬기’(메를로 퐁티)인가? 혹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라고 한다. 삶이란 ‘건강’(니체)인가? 어떤 의미, 어떤 맥락에서는 다 일리가 있다. 일리의 관점에서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나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어떤 ‘나’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있다. 나 없는 세상은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종종 그 어떤 나가 빠져 있다. 내가 보면서, 내가 말하면서, 그 어떤 나는 감춰져 있다! 보는 것이 그렇듯이, 그 말의 쓰임새가 보여주듯 보는 것이 사실상 말하는 것을 대체하듯이 봄(vision)이 나타내는 그 ‘거리’는 실은 나와 너가 접촉하고 애무하는 ‘관계’와는 다르다. 나는 감춰져 있지 않다. 또렷하다. 마찬가지로 너는 감춰져 있지 않다. 또렷하다. 나와 너는 관계한다. 애무한다. 사랑한다. 무지개 빛깔이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과녁을 향해 달리는 화살은 시원하지만 어딘가 섬뜩하다. 비스듬히 서있는 너는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볼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다 일리가 있다. 감춰질 수도 있다. 흐릿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나 없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 어떤 나를 감추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 그것은 기껏해야 절반이다. 절반은 온전하지 않다. 아무 것도 아니다. 누군가 그러더라. 그 때 ‘몫’이 아닌 ‘덤’의 기분으로 들었던가. ‘봄(spring)’ 같은 말이더라. 오래 기억해둘 만해서 여기에 기록해둔다. ‘흘러가는 물, 흘러오는 물.’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